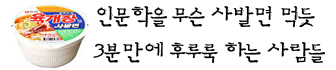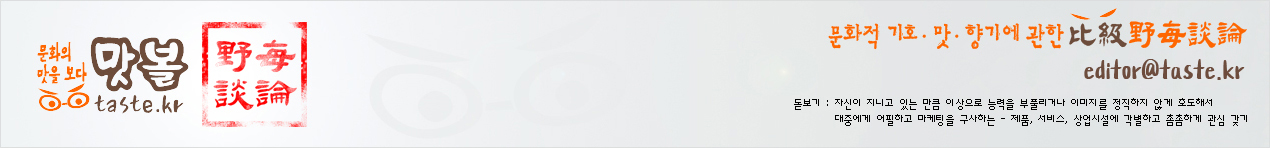반응형
카페 조명, 카페 가구, 빈티지 원목 가구, 마호가니, 카페 조명 조도, 색온도, 마호가니 가구, 농약 같은
개인카페 조명 온도, 빈티지 나무 테이블, 카페 조명 밝기 권장 추천, 가짜 원목가구, 카페 조명 정도, 우산

그것을 내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에 두면 마음이 안정되고 희열을 느끼거나,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의미가 되는 사물/환경이 사람에게는 한 두 가지씩 있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을 말하는 심리 용어들이 여럿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도 일종의 페티쉬(fetish)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 안면 정도가 있는 동호회 어떤 여성은 중학교 시절 비오던 등하굣길에 짧은 장우산을 가방에 삐죽 꽂고 다녔던 어느 시점부터 그 우산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투사하기 시작했는데, 40살이 넘은 지금도 비내림과 전혀 상관 없이 외출할 때는 백팩에 우산을 꽂고 다닌다. 우산이 없으면 그 분은 안절부절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렇다고 그분이 검도하는 냥반은 아님.
■ 어느 초등학생은 유아시절에 엄마가 깔고 덮어주며 키운 큰 비치타올을 5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끌고 다니는데, 소파에서 TV를 볼 때도 만지작거리고 잘 때는 덮거나 손에 쥐어야만 잠이 잘오고 안심이 된다고 한다. 타올 여기저기가 헤져서 구멍나고 실밥들이 나와서 되나캐나 마구 엉켜 있는데도 여전히 제일 소중한 존재인데, 어른들의 오랜 설득으로 최근에는 타올을 졸업하고 지금은 말랑말랑 쪼글한 애벌레 인형을 예뻐해주고 있다.
■ 많은 애완견들이 그런 경향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유독 스킨쉽 목숨집착견이 있다. 어디에서든 앉거나 누울 때는 자기 신체의 일부분 엉덩이나 옆구리를 반드시 사람의 몸에 댄 상태가 유지되어야 안심을 하는 그런 강아지. 주인이 살짝 몸을 뒤로 빼서 비접촉 상태을 만들면 강쥐는 본능적으로 자석에 땡겨 붙듯 몸을 움직여 다시 접촉 상태를 유지시킨다.
■ 나는 특정한 조도와 색온도의 조명과 나무 질감(특히 마호가니)에 정서적/감성적으로 정신을 못차리는, 몹쓸일 수도 향락적일 수도 있는 증상이 있는데, 이곳저곳 카페들을 둘레거리다가 이 예뻐라 요소를 담고 있는 곳을 발견하면 마르고 닳도록 드나든다.
그런데 나무라고 다 나무는 아닌 게 표면에 니스칠을 하거나 오래된 척하느라 장난질을 한 나무는 예뻐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자연스러운 원목틱 장난을 친 곳이 카페베네, 완전 딱 구린 스타일.
A, B, C는 상호와 무관한 나열순.
카페A
이건 뭐 참말로 정말 어떻게 말로다가 스스로 만족할만하게 형용할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공간감과 조명과 가구와 소품이다.
다녀본 곳들 중에서 공간 구성원들(가구, 소품, 배치, 공간감)과 노릇노릇한 조명이 어우려져 보여준 가장 알흠다운 자태를 지닌 스팟이 바로 카페의 이 지점. 이 카페의 모든 공간감이 이렇지는 않고 요기만 딱 이렇다.
이 지점의 조명과 가구는 내 일 공간의 그것과 정서상 닯은 점이 많아서 자주 가는 탓도 있다.

공간과 맥락도 맞지 않는 소품들 잡다구리 끌어 놓은 카페는 아주 하대하고 천대시하는데, 이 카페 창가의 석고상(누구지?)은 적재적소 그 자체이다.
이때는 낮이라서 창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 차 있는데, 어스름할 때 와서 여기 푹신 의자에 묻혀 앉아 졸면서 음악을 들을 때의 감성 상태는, 음악인들이 영감과 삘을 위해서 대마초를 피운다는 것과 원리가 같아 보인다. 꽤 좋은 이곳 음향시설도 한 몫한다.
(버스에 앉아 가다가 머리 앞뒤옆으로 꺾여가며 나른하게 조는 흐리멍덩 상태에서 듣는 라디오 음악도 그러하다)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조금 멀긴 하지만 호박고구마 빛의 노릇한 조명 맛의 농약 같음에 자주 안 갈 수가 없었다.
카페B

천장 높이와 역시 노릇노릇 어둑어스름한 조명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시효과를 위해 밝게 켜 놓은 벽 선반이 눈부신 게 아쉬움이라면 아쉬움.
나무에 세월감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자연 나무의 결이 좋고 가구들 전체가 반듯반듯 하니 미니멀한 느낌이 훌륭.
여기도 해가 거의 꺼질 시점에 맞춰서 자주 간다.
카페C

보시다시피 여기는 내가 아는 한 나무 냄새와 그 세월감의 종결자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컵 받침과 숟가락도 나무로 도배해주는 경우도 있다.


방문 초기에는 손톱으로 탁자 표면을 긁어서 밝은 톤의 속살을 내고 코 대고 맡는 나무냄새의 즐거움이 이 카페의 사이드메뉴격이었는데, 이제는 나무의 즐거움이 주메뉴이고 커피가 사이드메뉴랄까.
손톱으로 긁는 것도 많이 하면 티나서 들키거나, 긁는 모습이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목격될지도 모른다.
"손님 지금 뭐하세요?"
강아지가 제 나름의 목적을 달성코자 앞발로 최선을 다해 땅바닥을 바스샥 바스샥 긁어대고 있는데, 주인이 빤히 쳐다 보는 시선이 느껴지면, 머쓱해서 하던 일 얌전히 멈추는 것처럼.



이 카페가 만약 여러 이유로 가구들 그대로 업종을 커피점에서 주점으로 전환하면 내 앞에는 양자택일의 비극이 놓여진다.
- 술을 좋아라 하지 않는데 이곳에서 술만 팔면 (담배 연기도 가득 찰 것이니) 공간의 극악함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나무 냄새를 맡고 만지작거리러 가기는 힘들어질 것이니 정서 박탈감에 허우적 허우적....애벌레로 대체될 수 있을까?
- 아니면 술과 담배연기를 마시더라도 이 나무를 누리러 꾸역꾸역 찾아가긴 하지만, 건강 맛탱이에 비쌀 술값에 없는 재산 탕진해서 거지 꼴 못면하거나.

개인카페 조명 온도, 빈티지 나무 테이블, 카페 조명 밝기 권장 추천, 가짜 원목가구, 카페 조명 정도, 우산

그것을 내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에 두면 마음이 안정되고 희열을 느끼거나,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의미가 되는 사물/환경이 사람에게는 한 두 가지씩 있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을 말하는 심리 용어들이 여럿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것도 일종의 페티쉬(fetish)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 안면 정도가 있는 동호회 어떤 여성은 중학교 시절 비오던 등하굣길에 짧은 장우산을 가방에 삐죽 꽂고 다녔던 어느 시점부터 그 우산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투사하기 시작했는데, 40살이 넘은 지금도 비내림과 전혀 상관 없이 외출할 때는 백팩에 우산을 꽂고 다닌다. 우산이 없으면 그 분은 안절부절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렇다고 그분이 검도하는 냥반은 아님.
■ 어느 초등학생은 유아시절에 엄마가 깔고 덮어주며 키운 큰 비치타올을 5학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끌고 다니는데, 소파에서 TV를 볼 때도 만지작거리고 잘 때는 덮거나 손에 쥐어야만 잠이 잘오고 안심이 된다고 한다. 타올 여기저기가 헤져서 구멍나고 실밥들이 나와서 되나캐나 마구 엉켜 있는데도 여전히 제일 소중한 존재인데, 어른들의 오랜 설득으로 최근에는 타올을 졸업하고 지금은 말랑말랑 쪼글한 애벌레 인형을 예뻐해주고 있다.
■ 많은 애완견들이 그런 경향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유독 스킨쉽 목숨집착견이 있다. 어디에서든 앉거나 누울 때는 자기 신체의 일부분 엉덩이나 옆구리를 반드시 사람의 몸에 댄 상태가 유지되어야 안심을 하는 그런 강아지. 주인이 살짝 몸을 뒤로 빼서 비접촉 상태을 만들면 강쥐는 본능적으로 자석에 땡겨 붙듯 몸을 움직여 다시 접촉 상태를 유지시킨다.
■ 나는 특정한 조도와 색온도의 조명과 나무 질감(특히 마호가니)에 정서적/감성적으로 정신을 못차리는, 몹쓸일 수도 향락적일 수도 있는 증상이 있는데, 이곳저곳 카페들을 둘레거리다가 이 예뻐라 요소를 담고 있는 곳을 발견하면 마르고 닳도록 드나든다.
그런데 나무라고 다 나무는 아닌 게 표면에 니스칠을 하거나 오래된 척하느라 장난질을 한 나무는 예뻐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자연스러운 원목틱 장난을 친 곳이 카페베네, 완전 딱 구린 스타일.
A, B, C는 상호와 무관한 나열순.
카페A

이건 뭐 참말로 정말 어떻게 말로다가 스스로 만족할만하게 형용할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공간감과 조명과 가구와 소품이다.
다녀본 곳들 중에서 공간 구성원들(가구, 소품, 배치, 공간감)과 노릇노릇한 조명이 어우려져 보여준 가장 알흠다운 자태를 지닌 스팟이 바로 카페의 이 지점. 이 카페의 모든 공간감이 이렇지는 않고 요기만 딱 이렇다.
이 지점의 조명과 가구는 내 일 공간의 그것과 정서상 닯은 점이 많아서 자주 가는 탓도 있다.

공간과 맥락도 맞지 않는 소품들 잡다구리 끌어 놓은 카페는 아주 하대하고 천대시하는데, 이 카페 창가의 석고상(누구지?)은 적재적소 그 자체이다.
이때는 낮이라서 창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 차 있는데, 어스름할 때 와서 여기 푹신 의자에 묻혀 앉아 졸면서 음악을 들을 때의 감성 상태는, 음악인들이 영감과 삘을 위해서 대마초를 피운다는 것과 원리가 같아 보인다. 꽤 좋은 이곳 음향시설도 한 몫한다.
(버스에 앉아 가다가 머리 앞뒤옆으로 꺾여가며 나른하게 조는 흐리멍덩 상태에서 듣는 라디오 음악도 그러하다)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조금 멀긴 하지만 호박고구마 빛의 노릇한 조명 맛의 농약 같음에 자주 안 갈 수가 없었다.
카페B

천장 높이와 역시 노릇노릇 어둑어스름한 조명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시효과를 위해 밝게 켜 놓은 벽 선반이 눈부신 게 아쉬움이라면 아쉬움.
나무에 세월감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자연 나무의 결이 좋고 가구들 전체가 반듯반듯 하니 미니멀한 느낌이 훌륭.
여기도 해가 거의 꺼질 시점에 맞춰서 자주 간다.
카페C

보시다시피 여기는 내가 아는 한 나무 냄새와 그 세월감의 종결자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컵 받침과 숟가락도 나무로 도배해주는 경우도 있다.


방문 초기에는 손톱으로 탁자 표면을 긁어서 밝은 톤의 속살을 내고 코 대고 맡는 나무냄새의 즐거움이 이 카페의 사이드메뉴격이었는데, 이제는 나무의 즐거움이 주메뉴이고 커피가 사이드메뉴랄까.
손톱으로 긁는 것도 많이 하면 티나서 들키거나, 긁는 모습이 직원에게 현행범으로 목격될지도 모른다.
"손님 지금 뭐하세요?"
강아지가 제 나름의 목적을 달성코자 앞발로 최선을 다해 땅바닥을 바스샥 바스샥 긁어대고 있는데, 주인이 빤히 쳐다 보는 시선이 느껴지면, 머쓱해서 하던 일 얌전히 멈추는 것처럼.



이 카페가 만약 여러 이유로 가구들 그대로 업종을 커피점에서 주점으로 전환하면 내 앞에는 양자택일의 비극이 놓여진다.
- 술을 좋아라 하지 않는데 이곳에서 술만 팔면 (담배 연기도 가득 찰 것이니) 공간의 극악함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나무 냄새를 맡고 만지작거리러 가기는 힘들어질 것이니 정서 박탈감에 허우적 허우적....애벌레로 대체될 수 있을까?
- 아니면 술과 담배연기를 마시더라도 이 나무를 누리러 꾸역꾸역 찾아가긴 하지만, 건강 맛탱이에 비쌀 술값에 없는 재산 탕진해서 거지 꼴 못면하거나.

반응형
'마셔볼 음료 > 커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맥도날드 맥카페의 커피 홍보 문구, 한나절 넘도록 찬찬히 읽어 보기 (부제 : 아메리카노 커피 맛/품질 과대광고의 사례) (4) | 2012.11.05 |
|---|---|
| [종로 카페] 나무랄 데는 딱 한 가지 밖에 없는 훌륭한 커피 공간 / 카페 뎀셀브즈 (7) | 2012.10.23 |
| 커피교실 교육생을 1년 넘게 카페직원으로 부려 먹으면서 수강료는 받고 월급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종로구의 개샹노무시키 (5) | 2012.10.22 |